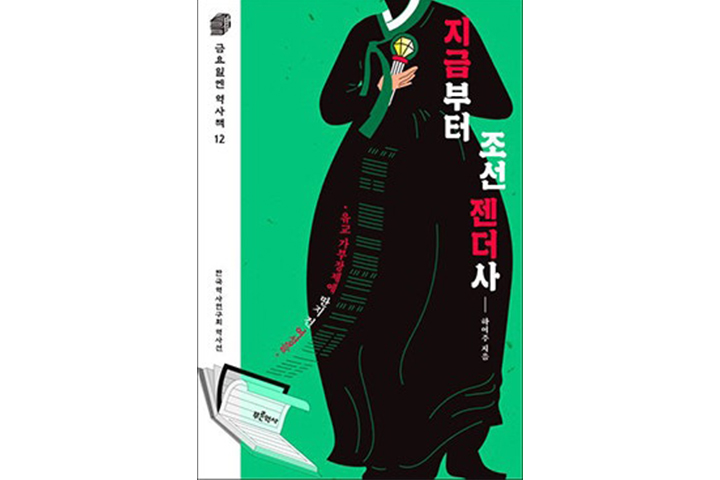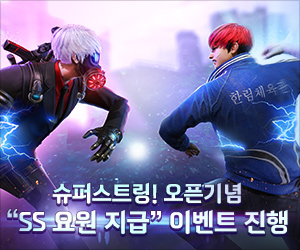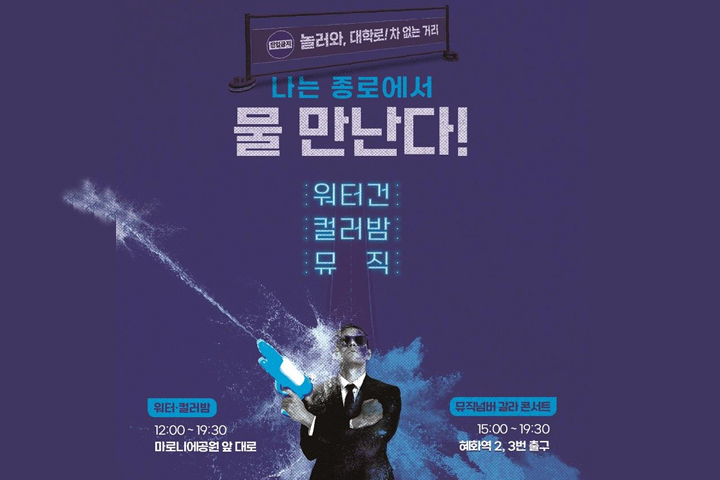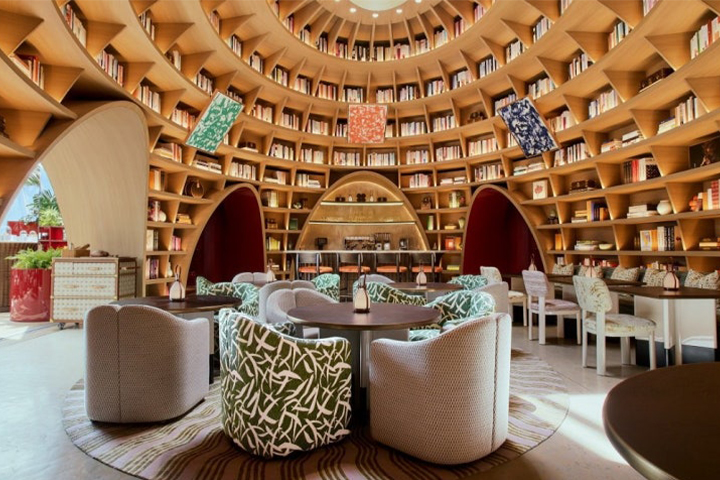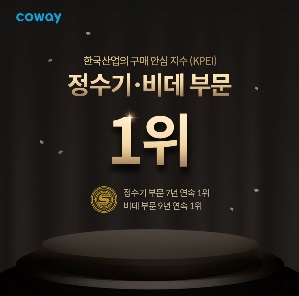조선시대 여성들의 충격적인 반란... '유교 걸'만 있었다는 오해는 금물!
최근 출간된 두 권의 책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여주 작가의 '지금부터 조선 젠더사'와 천양희 시인의 '너에게 쓴다'는 각각 역사와 문학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과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푸른역사에서 출간된 '지금부터 조선 젠더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 시대 여성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사극이나 대중 매체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조선 여성들이 유교적 젠더 규범에 순종적으로 따르기만 했을까? 저자 하여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여성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자란 인간이다"라는 당시 남성 중심 사회의 시각이 존재했지만, 조선 여성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머리에서 발톱까지 유교 규범으로 무장한 조선 남성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사회경제적·성적 권리와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면, 여성들 역시 그에 맞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했다.이 책에 따르면, 조선 여성들은 유교적 젠더 규범에 일정 부분 타협하면서도 자신의 출신 가문 정체성을 굳건히 지켰다. 또한 힘들게 남편과의 별거를 성취하기도 했으며, 당시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흡연 문화에 동참함으로써 기존의 '젠더 질서'를 교묘하게 무너뜨리기도 했다. 저자는 이러한 조선 여성들의 모습을 '은밀히 전쟁을 수행하는 주도면밀한 전략가'에 비유하며, 그들의 삶에 새로운 해석을 부여한다.한편, 창비에서 출간된 '너에게 쓴다'는 한국 시단의 거목 천양희 시인의 자선 시선집이다. 196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이래 60년의 시력(詩歷)을 쌓아온 시인은 이번 시선집에서 자신이 직접 고른 61편의 시를 선보인다."꽃이 피었다고 너에게 쓰고/ 꽃이 졌다고 너에게 쓴다"라는 구절에서 느껴지듯, 천양희 시인의 시는 대체로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다. 시집에 수록된 시편들을 통해 독자들은 삶이 시가 되는 시인의 여정을 엿볼 수 있으며,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예지를 만날 수 있다.표제시에 등장하는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내 일생이 되었다/ 마침내는 내 생(生) 풍화되었다'라는 구절은 60년 시인으로서의 삶과 태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시인은 '시인의 말'을 통해 "나는 잘 살기 위해서 시를 쓰지만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눈물을 보탠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은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 짧지만 긴 여운을 보내는 것이다"라는 말로 자신의 시작(詩作) 의미를 정리한다.두 책은 각각 역사와 문학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시각과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를 전달한다. 조선 시대 여성들의 은밀한 저항과 한국 현대시의 거장이 전하는 삶의 통찰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